-
'김헌창'의 혈통은 '무열왕계'다 (김헌창의 난 Part.1)시사상식/역사 2023. 8. 24. 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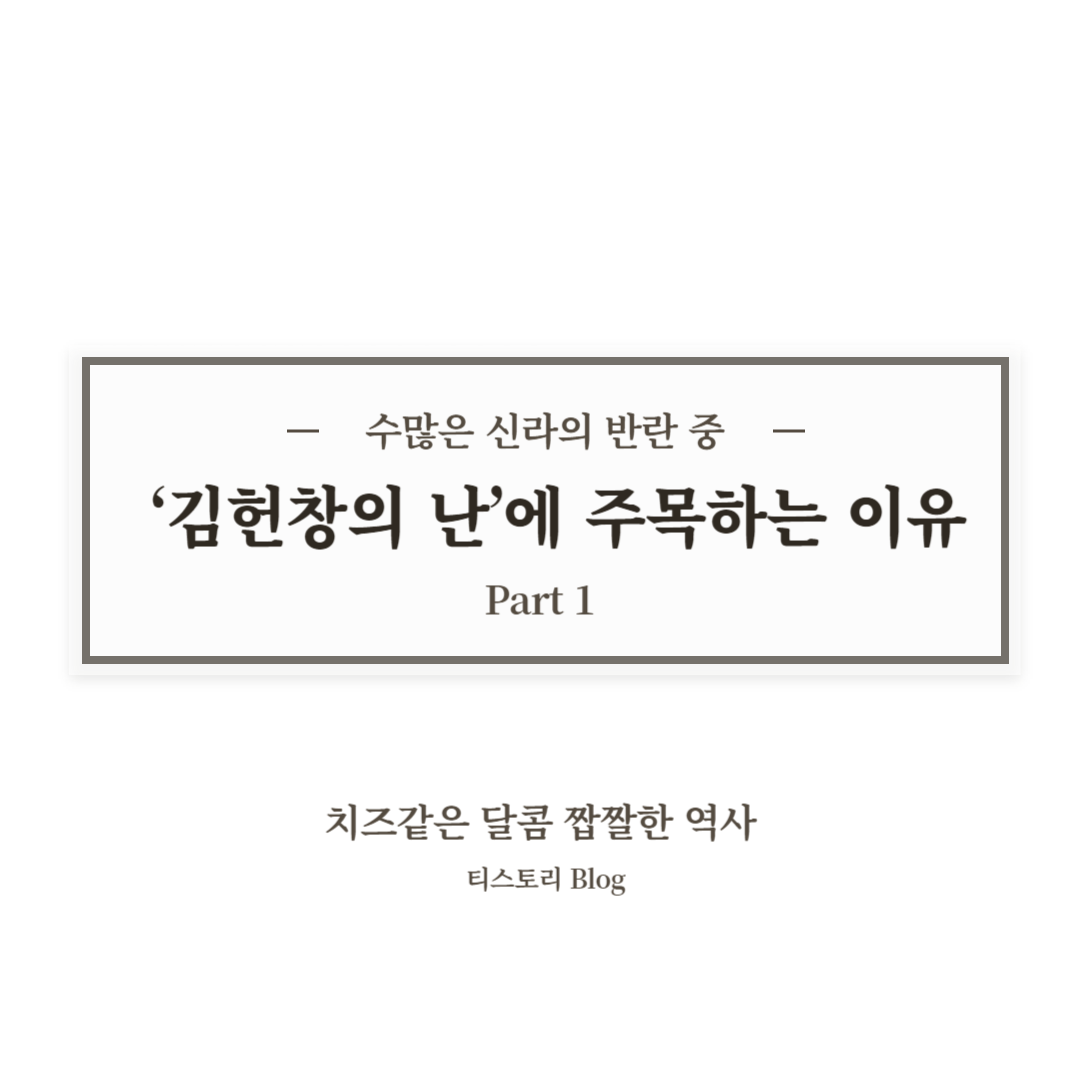
‘김헌창의 난’이란?
약 천년 간의 오랜 기간 존속한 신라. 삼국 통일 후 강력한 왕의 권위로 통치한 '중대'라는 시기. 신라가 혼란해지는 '하대'의 시기를 가르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다. 바로 이번 포스팅 주제인 '김헌창의 난'이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김헌창의 난이란?"같은 막막하고 따분한 주제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천년의 신라 역사, 수많은 반란이 있었다.
그중 학계에서 주목하는 반란, 혹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반란이 몇 개 있다. (김흠돌의 난, 김헌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 애노의 난 등)
신라의 수많은 반란 중, 왜 이 몇 개의 반란에 주목하고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선 '김헌창의 난'이 주목받는 이유를 집중해부해볼까 한다.
먼저 김헌창의 난. 대체 뭘까. 간단히 정의를 보고 시작하자. '두산백과'를 보자.헌덕왕 14년(822년) 신라의 웅천주(熊川州:지금의 공주) 도독(都督) 김헌창이 일으킨 난.
두산백과 김헌창의 난이 내용에서의 키포인트는 뭘까?
'헌덕왕 14년'이라는 시기, '공주'라는 지역. 그리고 '김헌창'이라는 인물.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된다. 좀 궁금해진다.
'김헌창'이라는 사람은 '헌덕왕 14년' 이란 시점에, 왜 '공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을까?
반란의 배경 1
1. 김헌창은 누구인가
반란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김헌창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삼국사기에 김헌창의 난을 언급한 부분에서 힌트가 있다.14년(822) 3월에 웅천주(熊川州) 도독(都督) 헌창(憲昌)이 아버지 주원(周元)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라 이름을 장안(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만들어 경운(慶雲) 원년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헌덕왕 14년(822) 3월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
이게 김헌창이 누군지 알 수 있는 핵심 부분이다. 이 문장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다.아버지 김주원은 '왕'이 될 수 있던 사람이다.
아버지 김주원이 대체 누구이기에. 왕이 될 수 있던 사람이었을까.2. 김헌창 아버지 김주원의 혈통
신라의 골품사회에서 '왕'이 되기 위해선 출신이 가장 중요했다. 먼저 김주원의 출신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령 성주사지의 낭혜화상탑비를 들여다보자. 김주원의 증손자 김흔이 자신의 조상이 '김인문(金仁問)'임을 밝힌다.때마침 왕자 흔(昕)은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며 산중(山中)의 재상(宰相)으로 불렸는데, 우연히 바라는 바가 합치되었다. (흔이) 말하기를 "스님과 나는 함께 용수(龍樹) 을찬(乙粲)을 조상으로 하고 있으니, 스님의 안팎으로 모두 용수(龍樹)의 자손입니다....중략
지금 웅천주(熊川州) 서남쪽 모퉁이에 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나의 조상인 임해공(臨海公){휘(諱)는 인문(仁問)이고, 당나라가 예맥(濊貊 : 고구려를 말함)을 정벌할 때에 공이 있어서 임해공(臨海公)으로 봉해졌다.}께서 봉토로 받은 곳입니다.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문여기서 언급하는 '김인문'은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다.
박시형(朴始亨)의 기문에, “임영은 예국(濊國)의 터이다. 예전 명도(溟都)이며, 삼한(三韓) 때에는 북빈경(北濱京)이었다. 고려 동원경(東原京)이라 불렀는데, 이는 신라 태종(太宗)의 5대손 주원공(周元公)이 도읍하여서 여러 대로 살았던 까닭에 이름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44권 강릉대도호부즉, 김주원은 무열왕의 혈통인 왕족인 것이다.

그다음 확인해 볼 건 어느 정도 서열의 왕족이냐는 문제다. 삼국사기에서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이라는 문장을 다시 생각해보자.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었다는 건 왕위에 근접한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있다.선덕왕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었다. 여러 신하들이 논의한 후에 왕의 족자(族子, 친족) 주원(周元)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그때 주원은 수도 북쪽 20리 되는 곳에 살았는데, 마침 큰 비가 내려 알천(閼川)의 물이 불어나 주원이 건너올 수 없었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임금이라는 큰 지위는 진실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폭우가 내리니 하늘이 혹시 주원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상대등 경신은 전 임금의 동생으로서 덕망이 높고 임금의 체통을 가졌다.”
이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경신에게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얼마 후 비가 그치니 백성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삼국사기 원성왕 즉위년(785) 1월얼마 지나지 않아 선덕왕(宣德王)이 세상을 떠나매, 나라 사람들이 김주원을 왕으로 받들어 장차 궁중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그의 집은 북천 북쪽에 있었는데 홀연히 냇물이 불어나 건널 수가 없었다. 이에 왕이 먼저 궁궐로 들어가 왕위에 올랐다. 상재(上宰)의 무리들이 모두 와서 그를 따랐으며, 새로 즉위한 왕께 경배하고 축하하니 이가 원성대왕이다.
삼국유사 제 2기이 원성대왕
원래는 선덕왕이 죽자 왕의 친족 중 김주원을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던걸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김주원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도 아니었다. 다된 왕을 놓쳤으니 0순위다.
그러나 위의 기록들을 보면 김주원이 큰비에 궁궐에 갈 수 없어 상대등 김경신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단지 큰비에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건 거짓일 것이다. 아마 상대등 김경신과 김주원간의 강한 알력다툼이 있던 듯하다.
삼국유사엔 원성왕 김경신이 왕이 되기 전 꿈에 대한 해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김경신은 스스로 본인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해몽하기를 청하자 아찬은 “복두를 벗은 것은 위에 거하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소립을 쓴 것은 면류관(冕旒冠)을 쓸 징조이며, 12현금을 든 것은 12대손까지 왕위를 전한다는 조짐이며,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 것은 궁궐로 들어갈 상서로운 조짐입니다.”라고 하였다.
“위에 주원이 있는데 어찌 왕위에 오를 수 있겠소?” 왕이 말하자 아찬이 대답하기를 “청컨대 은밀히 북천신(北川神)에게 제사지내면 될 것입니다.” 하자 [왕은] 이에 따랐다.
삼국유사 제 2기이 원성대왕김주원이 김경신보다 위였다. 스스로 알고 있었다. 또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소"에 대한 답변에 "따랐다"라는 언급을 생각해보자.
김경신은 왕이 될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했던 걸 추측해 볼 수 있다.
원성왕이 왕위에 오르고, 서열 0순위 김주원은 정치보복의 위협을 피해 명주(지금의 강릉)로 가 자리 잡는다.신라 김주원(金周元) 태종왕(太宗王)의 손자이다. 당초에 선덕왕(宣德王)이 죽고 후사가 없으므로, 여러 신하가 정의태후(貞懿太后)의 교지를 받들어, 주원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왕족 상대장등(上大長等) 경신(敬信)이 뭇사람을 위협하고, 먼저 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었다. 주원은 화를 두려워하여 명주로 물러가고 서울에 가지 않았다. 2년 후에 주원을 명주군 왕으로 봉하고 명주 속현인 삼척ㆍ근을어(斤乙於)ㆍ울진(蔚珍) 등 고을을 떼어서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자손이 인하여 부(府)를 관향(貫鄕)으로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44권 강릉대도호부 인물 김주원
당시 수도인 경주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강원도로 갔다는 것. 그만큼 왕이 될 확률이 높으니 화가 미칠 가능성이 컸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왕위계승 서열 0순위 김주원의 세력은 엄청 컸던 것 같다. 김주원이 명주에 자리 잡자 명주군왕의 칭호를 내린다거나, 이후 그의 아들인 김종기가 '시중' 등의 고위관직에 오르는 모습도 볼 수있다.6년(790)
봄 정월에 종기(宗基)를 시중(侍中)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원성왕이는 원성왕이 김주원 세력의 인정해 주면서, 부족한 정통성을 채우고 왕권을 안정시키려 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자1. 김헌창은 김주원의 아들이다.
2. 김주원은 무열왕계의 혈통으로 왕위 계승 서열 0순위였다.
3. 김경신이 김주원이 왕이 되는 것을 막고 왕위에 오른다.
4. 김주원은 정치적 화를 피해 강릉에 자리 잡는다.
5. 김주원의 세력을 인정해 그의 아들(무열왕계)은 여전히 중앙에서 세력을 유지했다.
정리해 보니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납득이 간다.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 그만큼 유력한 인물이었다.
여기서 조금 수상한 점이 있다. 김헌창의 난이 822년이고,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건 785년이다. 바로 37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불만이 수십년만에 갑자기 터졌을리는 없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 지 다음 포스팅에서 더 알아보자.'시사상식 >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헌창의 난 의의와 한계 & 에피소드 (김헌창의 난 Part.4) (1) 2023.09.07 김헌창에게 '공주(웅천주)'란? 반란의 시작과 끝 (김헌창의 난 Part.3) (2) 2023.09.06 내물왕계 신라판 수양대군의 등장(김헌창의 난 Part.2) (1) 2023.08.27